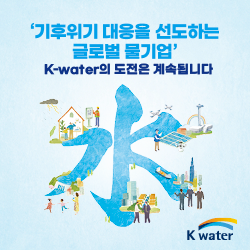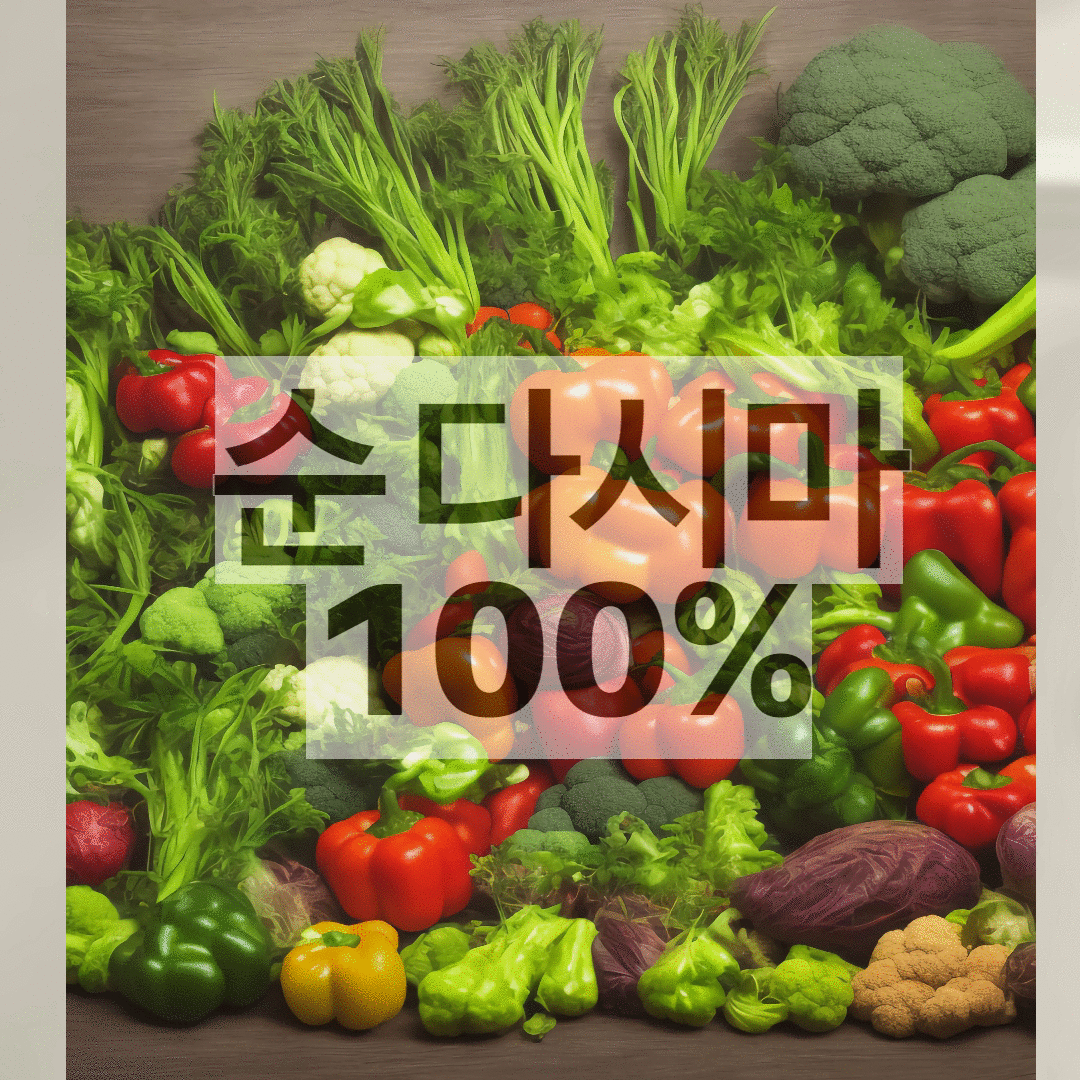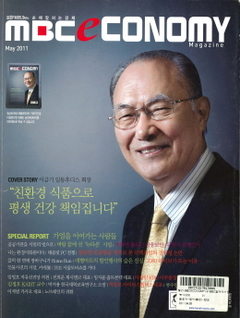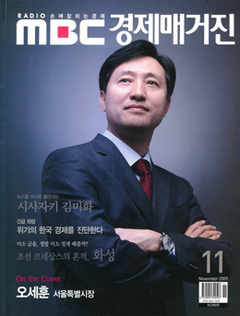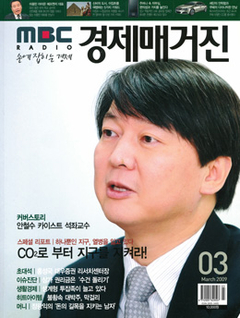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 연구하는 않는 나라의 비극
1929년 가을에서 1930년 가을에 걸쳐 미국의 동양 식물원정대가 한반도에서만 수집한 야생종 및 재배종 콩의 종자와 표본는 3,379점이었다. 이외에도 원정대는 한반도 콩의 재배와 수확, 가공 과정을 담은 흑백사진. 탐험대의 관찰 노트, 농촌 및 민속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도합 만여 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콩 종자와 표본은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 서비스(ARS)의 유전자원 창고와 ARS가 관리하는 국립 식물 유전자원 시스템(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n. NPGS)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GS는 농업적으로 중요한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연구, 육종 및 교육 목적으로 유전자원(종자 및 기타 번식 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곳이다.
문제는 정작 콩의 원산지인 한국에서는 탐험대가 수집한 소중한 자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들이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를 훑으며 콩 종자를 수집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내의 어느 대학도, 수백 명의 박사가 근무한다는 농촌진흥청 등의 어느 연구기관도 미국이 수집한 미답의 우리나라의 방대한 콩 유전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을 필자는 찾지 못했다.
필자의 과문 탓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그들이 수집한 콩 종자들을 활용해 고소득 고단백질 품종을 만들어 세계 콩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다. 한반도에서 열심히 수집한 씨앗이 이 대륙의 곳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잊어버린 콩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14년 전에 있었다. 광주 MBC가 설을 맞아 우리의 전통 식품인 '콩'을 소재로 한 HD 다큐멘터리 3부작, '콩, 인류를 살리다'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워싱턴에 소재한 ARS를 방문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수집한 콩 종자를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미국 종자 보존소의 한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콩의 원산지 중 하나이며 지금도 한국산 종자가 연구의 핵심“이라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보여준 자료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70년대 수집한 표본의 일부에 불과했다. 아마도 취재팀은 1929년 원정대가 채집한 한반도 고유 콩 유전자들의 행방을 물었을 것이고 그것을 촬영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 MBC가 요청한 한반도에서 가져온 콩 종자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을지 모른다. 그것들은 식량안보 핵심자원이라면서 말이다. 그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더 충격은 탐험대가 수집한 한반도 콩종자에 관한 논문이나 공식 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필자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콩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100년전에 수집해 간 당시 콩 종자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 둔단 말인가?
필자가 이와 관련해 어렵게 찾은 논문은 「Characterization of Select Wild Soybean Accessions」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 농무성이 보유한 콩유전자원 수집품종 가운데 만주, 조선, 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야생종 계통은 1168개 종이었다.
지난 100년을 우리가 콩에 대한 역사를 잊고 지내는 사이,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서 콩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가 됐다. 우리 땅의 종자를 미국에서 역수입해 먹는 가련한 현실, 이것이 바로 연구하지 않는, 기록하지 않은 결과다. 물론 그동안 국내에 콩박물관이 생겼고 개인적으로 야생종을 수집하는 애국자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박물관을 세운다고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K-food 콩 원산지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다. 한반도의 기후, 토양, 농경문화, 선택 유전학의 집합체다. 콩 한 알 속에는 수 천 년 동안 쌓인 땅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박사는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종자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테어난 콩이 우리 밥상으로 귀환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연이 아닌 지식의 배신때문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