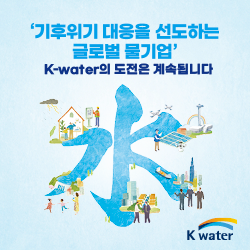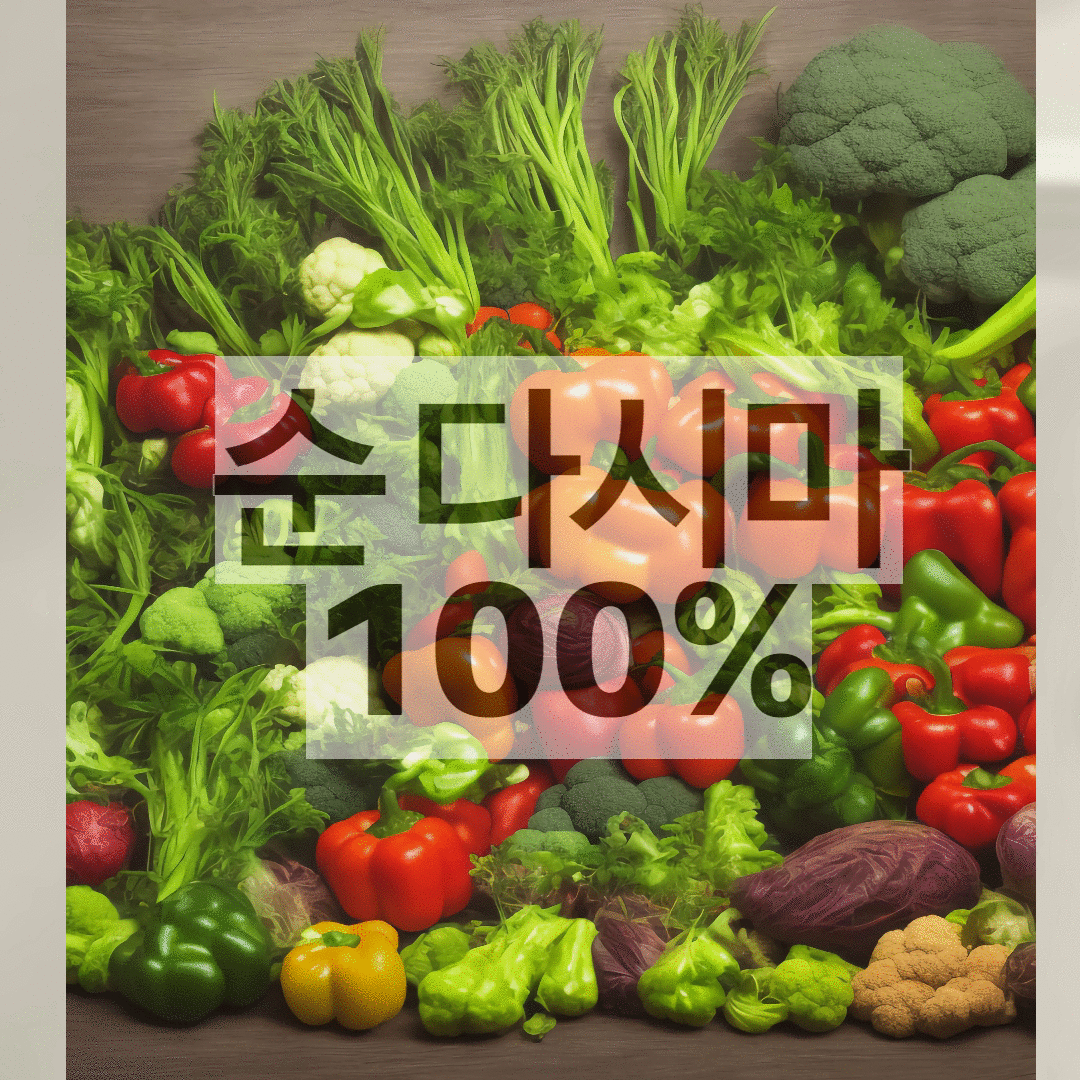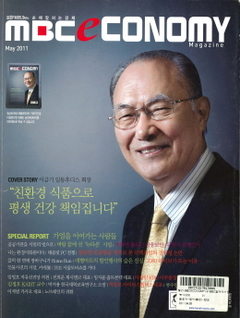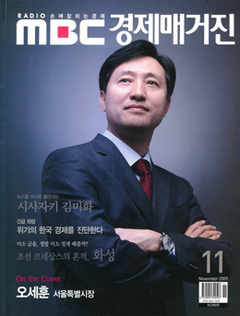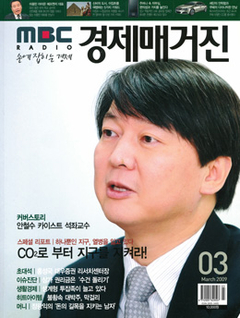리튬 1차전지 전문기업 아리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리튬 전지가 연쇄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공장 내부의 잔존 가스와 공정 과정의 전극 처리 불량이 배터리 열폭주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리셀이 공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장 내부의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박 대표는 본인이 아리셀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 사업자로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리셀은 휴대폰 금속 부품을 만드는 에스코넥 계열사로, 리튬-염화싸이오닐(Li-SOCl₂) 1차전지를 주로 제조해왔다.

◇배터리 내 잔존 가스와 전극 부품 결함이 결합해 만든 화마(火魔)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리튬-염화싸이오닐 1차전지는 가스·수도·전기 계량기의 장기 전원이나 무선 경보기·침입 감지기의 비충전 전원 등이다.
배터리는 크게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나누는 데, 1차전지는 방전되어도 충전이 안되는 전지로 망간 건전지와 알카라인 건전지 등이 있고, 5~10년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속성이 좋다. 아리셀은 계량기와 국방용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차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며, 충전 물질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2차전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리튬이온 전지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다.
다만, 1차전지와 2차전지 모두 배터리 열폭주의 위험을 안고 있다. 아리셀 사태는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내 잔존 가스와 배터리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전극의 결함이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리셀 배터리에서 과연 무슨 일이?
배터리 속에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미세한 흠집이 남거나, 전해액이 완벽하게 주입되지 않으면, 배터리 내부에 불필요한 가스가 미량이라도 남을 수 있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흔든 뒤 마개를 따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다. 배터리 내부의 가스는 평소에는 잠잠하지만, 충격이나 열을 받으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간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열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가연성 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가스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폭발 위험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폭탄’ 역할을 한다.
배터리 전극은 전기를 이동시키는 부품이다. 전극을 만들 때 흠집이 생기거나,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거친 부분이 남을 수 있고, 특히 생산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 이런 불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극이 불량하면, 배터리 안에서 양극과 음극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된다. 배터리 내부에 아주 작은 합선이 생기면,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 내부 잔존 가스와 전극 처리 불량이 만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전극의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배터리 안에서 작은 합선이 발생하고, 주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때 배터리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의 압력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터리가 폭발하면, 옆에 있는 배터리까지 터뜨리는 열폭주가 일어난다.
아리셀 화재는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서두르며, 건조·진공·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절차를 줄인 선택이 배터리 내부의 잔존 가스와 전극 처리 불량이라는 불씨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납기 압박이 거세질수록 조립 라인 정지는 미뤄졌고, 공정 과정에서 경고 신호는 지켜지지 셈이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23명의 사망 선고가 이미 공정 현장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