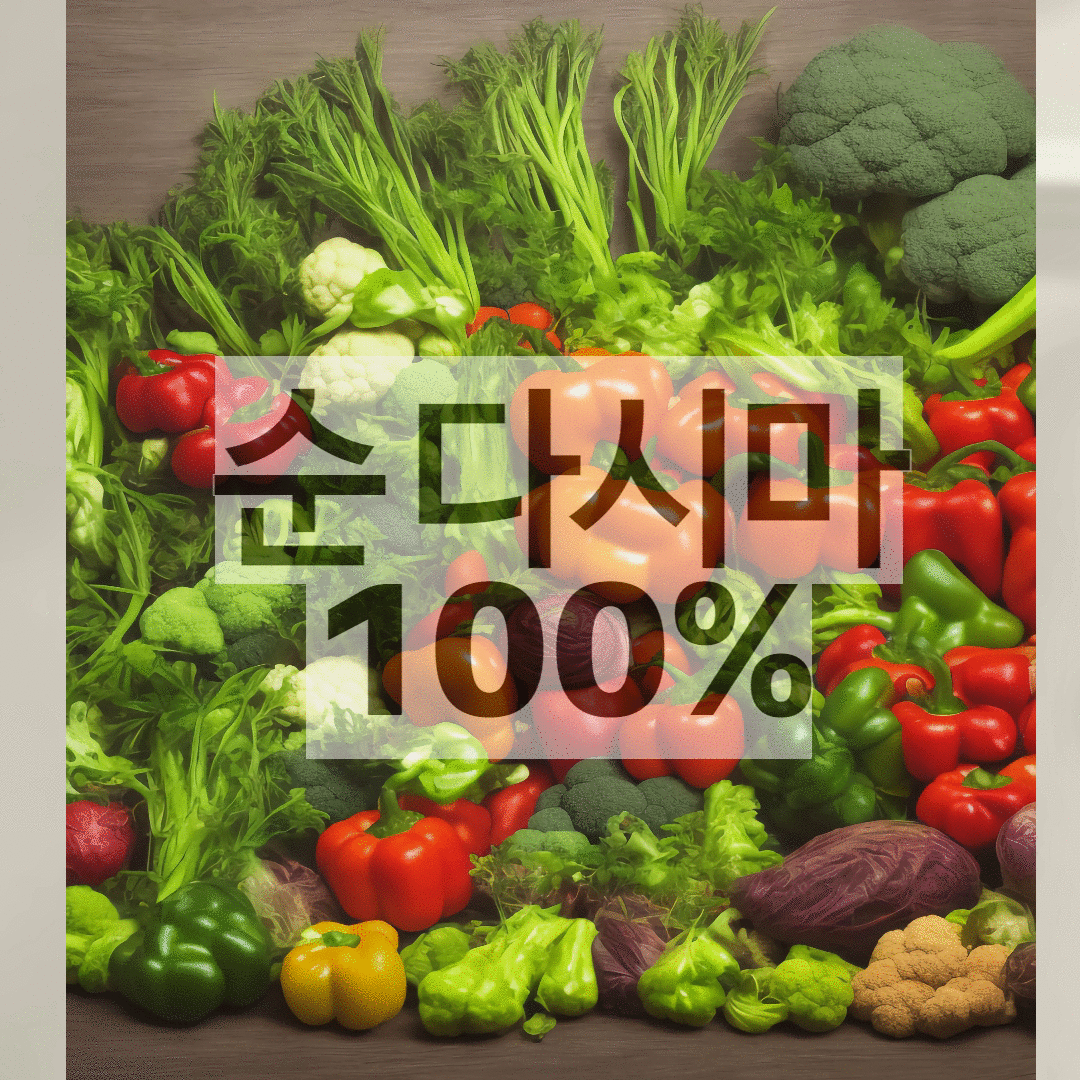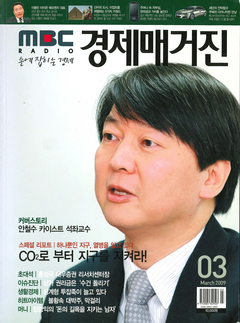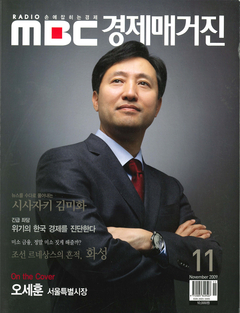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흔히 식당, 미용실, 학원 등 가게를 양도할 때 당사자들은 권리금을 주고받는다. 일반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각종 이름으로 권리금이 오가고 있으나 지켜야할 조건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고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다른 미용실을 차리면서 소송까지 불거졌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미용실 영업일체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위 미용실 인근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한 피고를 상대로 그 영업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내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도 후 300m 거리에 다른 상호로 개업
B 씨는 울산 동구 ◎◎동에서 ‘◇◇머리’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 오던 중 다음과 같이 생활정보신문에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전하동 △△△빌상가 1층 미용실 23.14㎡ |
A 씨는 2014년 7월17일 B씨로부터 미용실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양수대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 8월13일 임대인 C 씨와는 미용실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1천만원)과 월세(35만원), 그리고 임대차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계약체결 후 2014년 8월21일부터 미용실영업을 시작하면서 상호와 간판을 ‘▼▼머리’로 변경했다. 한편 B 씨는 2014년 11월1일부터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지역(울산 동구 ◎◎◎ 지상 건물 1층)에서 ‘00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새로 개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인근에서 겸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A 씨는 자신이 미용실영업일체를 양수했으니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설령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용실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대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사건 미용실인근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A 씨는 B 씨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2024년 8월13일까지 미용실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위 ‘00헤어’의 영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 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B 씨의 영업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럼 여기서 A 씨가 주장하는 영업양도는 무얼 말하는 것일까? 영업양도는 물건·권리·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을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영업양도라 할 수 있다.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등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폐지,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양도, 無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야
울산지법 재판부는 “법(상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는 영업양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활정보신문에 낸 광고 문구도 참작했다. 게재한 광고내용에는 ‘타 업종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B 씨의 의사는 미용실 건물의 임차권과 미용실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A 씨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을 ‘◇◇머리’에서 ‘▼▼머리’로 변경했는데, 미용실의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피고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양도로 보기에는 양도금액이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A 씨와 B 씨 사이에 정한 2천만원은 그 액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약정도 했다고 보기 어렵다
A 씨는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은 합계 575만5천원에 불과하다”면서 “B 씨가 이 금액보다
훨씬 큰 2천만원을 받았으니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용실의 양도당시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가 575만5천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2천만원에는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A 씨의 주장과 같이 위 2천만원이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의무 명확히 해야
법무법인피플 유정은 변호사는 “판례에서 적시한 것처럼 업이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라면 영업양도로서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경업금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사안마다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단순히 개별 자산을 넘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사업 자체를 일체로 양도해 영업양도가 될 경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게 인수 시 최대한 꼼꼼히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규모 가게에 대한 거래도 늘어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인해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도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살펴본 결과 인수자들은 권리금을 지급했으니 영업양도라 경업금지를 주장하지만 구체적 사안마다 특수성이 다 달라 판결도 달랐다. 창업이나 이전을 위해 가게 인수 계약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였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