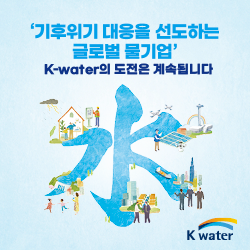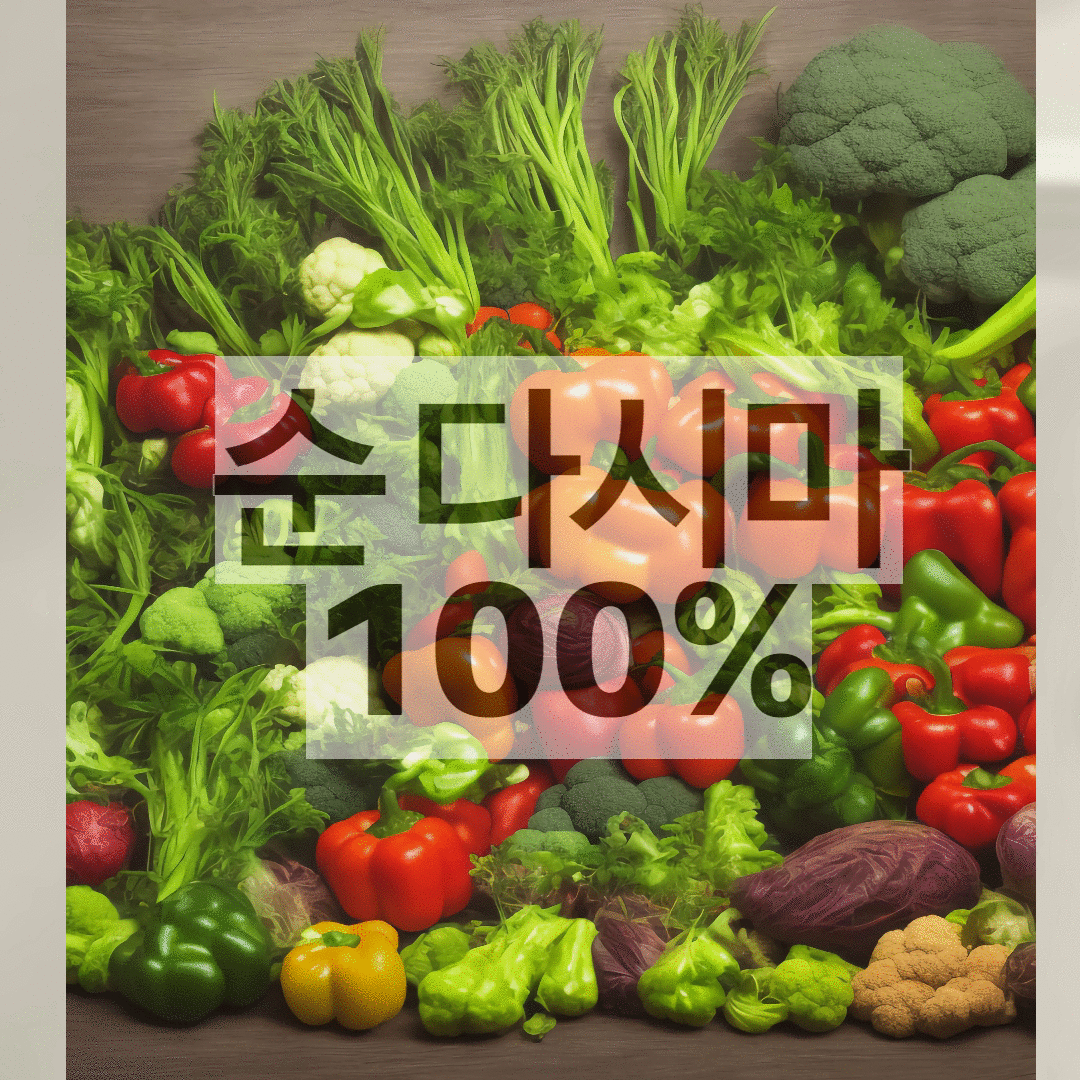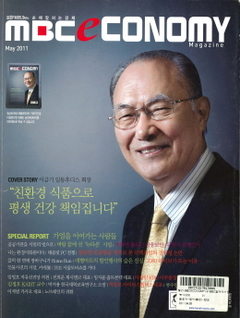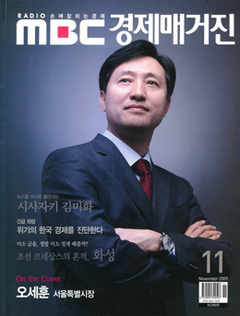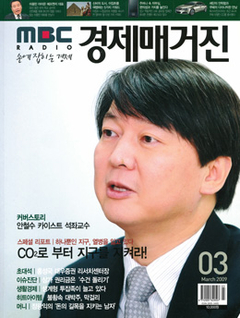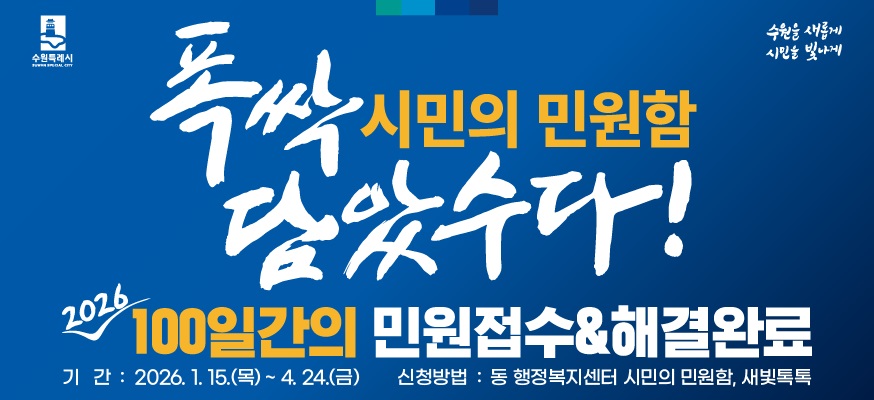옛사람들은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말했다. 허풍이 아니다. 과학이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의 78%를 차지하는 질소 분자(N₂)의 단단한 3중 결합이 깨진다(산소는 21%, 기타 1%가 차지한다). 깨진 질소는 산소와 만나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와 같은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비에 섞여 질산염(NO₃⁻)으로 변하면 흙으로 스며들고 식물은 비로소 이를 뿌리로 흡수하여 질소라는 무기물 영양소를 얻는다.
그래서 번개가 자주 치는 해는 농사가 잘되었다. 농부들은 ‘하늘에서 질소 영양소를 주었으므로 번개가 흙에 숨결을 불어 넣고 식물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개처럼 일산화질소를 합성하는 기계 장치를 개발해 인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 빗물이 차단되는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에서 비료를 쓰지 않고도 빗물을 먹고 자라는 노지(露地)에서처럼 건강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최은하 교수(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장)팀이다.
이들은 최근 플라즈마(번갯불이라고 생각하자) 방전 기술을 이용해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번개가 하늘에서 하던 일을 ‘일산화질소 플라즈마 활성수 제조기기’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질소를 물에 녹여 ‘플라즈마 활성질소수(活性窒素水)’를 만들고 배추, 딸기 등에 관수 형태로 주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작물의 생육이 30~70%가 향상되고 잎과 과실은 더 진한 색을 띠며 당도와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지는 등 맛과 영양 성분이 개선됐다. 더구나 일반비료 사용량이 줄고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농약사용량이 떨어졌다. 덩달아 흙은 건강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성질소수만으로도 식물이 잘 자라고 병충해가 덤비지 못했던 걸까?
최 교수는 “인공번개로 생성된 질산은 자연의 질소순환을 닮아 흙과 물의 생태를 망치지 않고 작물의 생리작용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번개로 만들어진 일산화질소는 극미한 분자여서 뿌리로 흡수되고 식물 내부에서 비료도 아닌 것이 질소비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리작용을 자극하는 ‘신호 전달물질’로도 기능했다. 이를테면 가뭄이나 염분 스트레스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식물 세포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뿌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인공질소비료는 물 1리터를 기준으로 3g의 다량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 뿌리가 이를 전부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흙에 잔류하게 함으로써 염류집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인공질소비료에는 일산화질소 성분이 전혀 없어 식물 성장만을 촉진하는 단순 기능만을 한다. 반면 플라즈마 활성질소수는 질소함량이 일반질소비료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질소가 흙에 잔류하는 일이 없고 미량으로도 식물 내부에서 충분한 영양이 되어주고 생리 활성 작용까지 담당한다.
최 교수 연구팀은 현재 식물이 함유한 플라즈마 일산화질소와 활성질소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다. 일산화질소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산화질소를 녹인 플라즈마 활성질소수를 실용화한다면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될까?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원리를 빌려 흙이 스스로 숨 쉬게 하는 탄소배출이 없는 비료 시대를 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공번개에 의한 일산화질소의 등장, 이는 우리나라 과학의 진보이자 생명의 겸손한 복원이며 우리 농업의 진정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