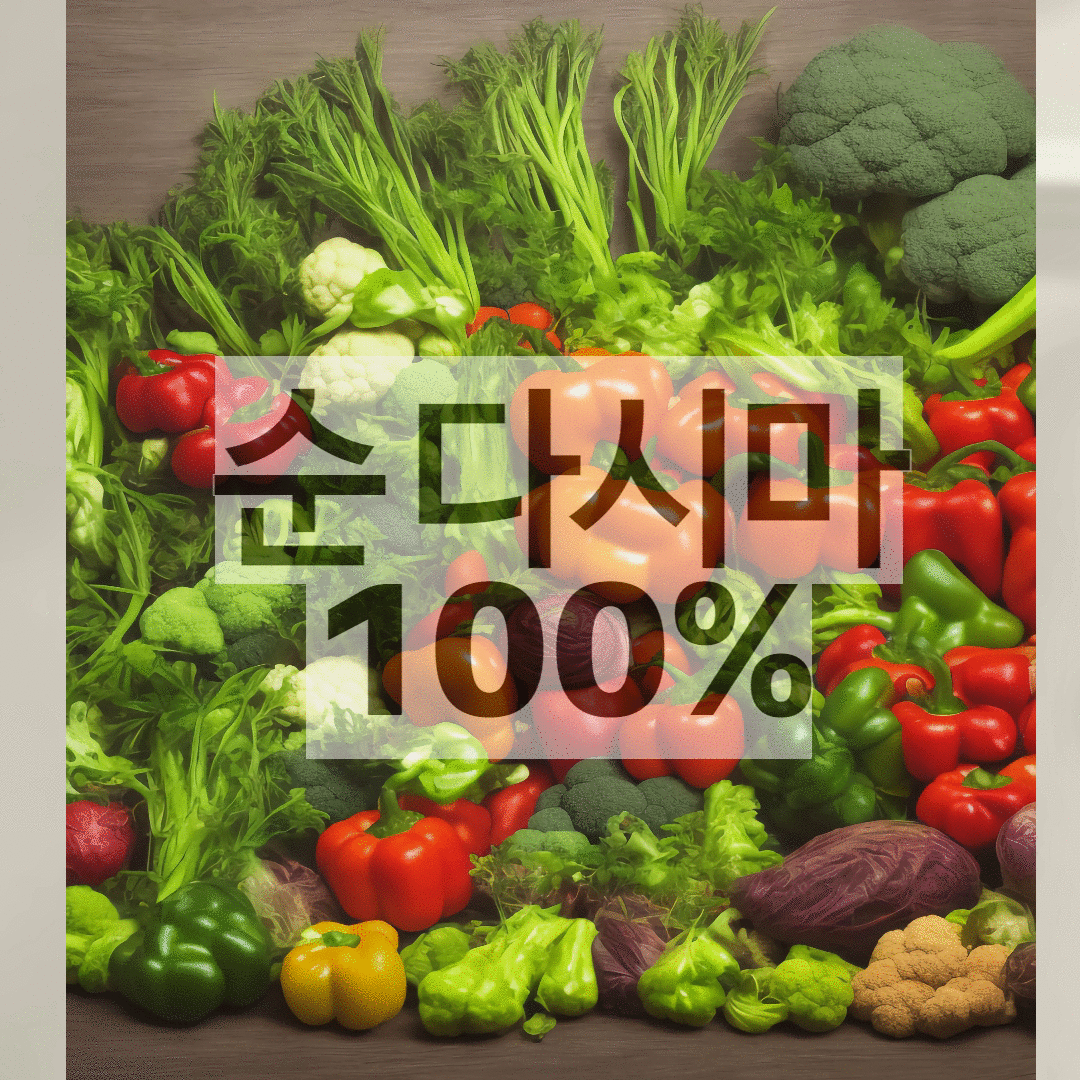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나와 마주 앉은 70대 초로의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정신연령이 낮았던 것 같아.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 선배가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듯해서 “나이 들면 대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위로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작 답답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다른 선배나 후배, 그리고 동료들과 비교해 일찍 철이 들지 못하고 이일 저일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아뿔싸! 저도 그렇네요.” 나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선배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많은 대화를 했다.
돌이켜 보면 정치학 공부를 계속해 학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먹고살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미뤄왔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겨우 나이가 들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아마 철이 든 모양이다-며 50년 전 대학 시절에 사두고 읽지 못한 원서를 몇 장씩 읽기 시작했다.
요즘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 좌절을 권력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D. Lasswell, 1902~1978)의 《Power and Personality, 권력과 개성》을 보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난해한 문장이나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나는 철이 들지 않은 젊은 시절과 달리 침착하게 앞뒤 문장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면 어려운 문장이 이해된다. 그럴 때 ‘으음. 내가 나이를 헛먹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그 길고 긴 세월을 허송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보고 배운 게 많았던 모양이다. 만약 철이 들지 않은 젊은 나이였다면 ‘이게 뭔 소리야?’라면서 멀찌감치 보던 책을 던져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연령이 높아진 나이가 되니 해마다 다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 그런 뜻이로구나” 모든 것을 절로 깨우치게 되니까.
나이 듦의 정신연령이 주는 힘은 정치나 유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 벽보마다 거리마다 얼굴을 내건 후보들이 웃고 싸우고 약속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도 각자 판단하고 분노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얼마나 성숙해 있는 걸까?
우리는 투표할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성숙한 유권자가 되는 줄 안다. 그러나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선거 정신연령은 별개의 문제다. 마치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10대처럼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듯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단기적인 이권을 쫓아가는 이들도 있다. 아예 무관심한 층도 많다.
선거 정신연령이란 결국 정치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책임감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긴 호흡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바로 선거의 철 듦이다.
어느 세대는 민주화의 열망을 몸으로 겪었다. 어떤 세대는 외환위기의 아픔과 청년실업 속에서 자라났다. 지금의 2030은 기후 위기와 주거 불안을 일상의 현실로 안고 있다. 세대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차이가 단순한 입장의 차이뿐 정신연령의 높낮이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리라. 다만 각 세대가 얼마나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가, 그 점에서 성숙도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단지 내 삶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일이다. 누가 덜 밉고,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의 문제 역시 절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의 성숙한 판단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선배는 자신이 일찍 철들었다면 더 큰 성취를 이뤘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정신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나은 지도자를 뽑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가오는 대선, 우리는 어떤 정신연령으로 투표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