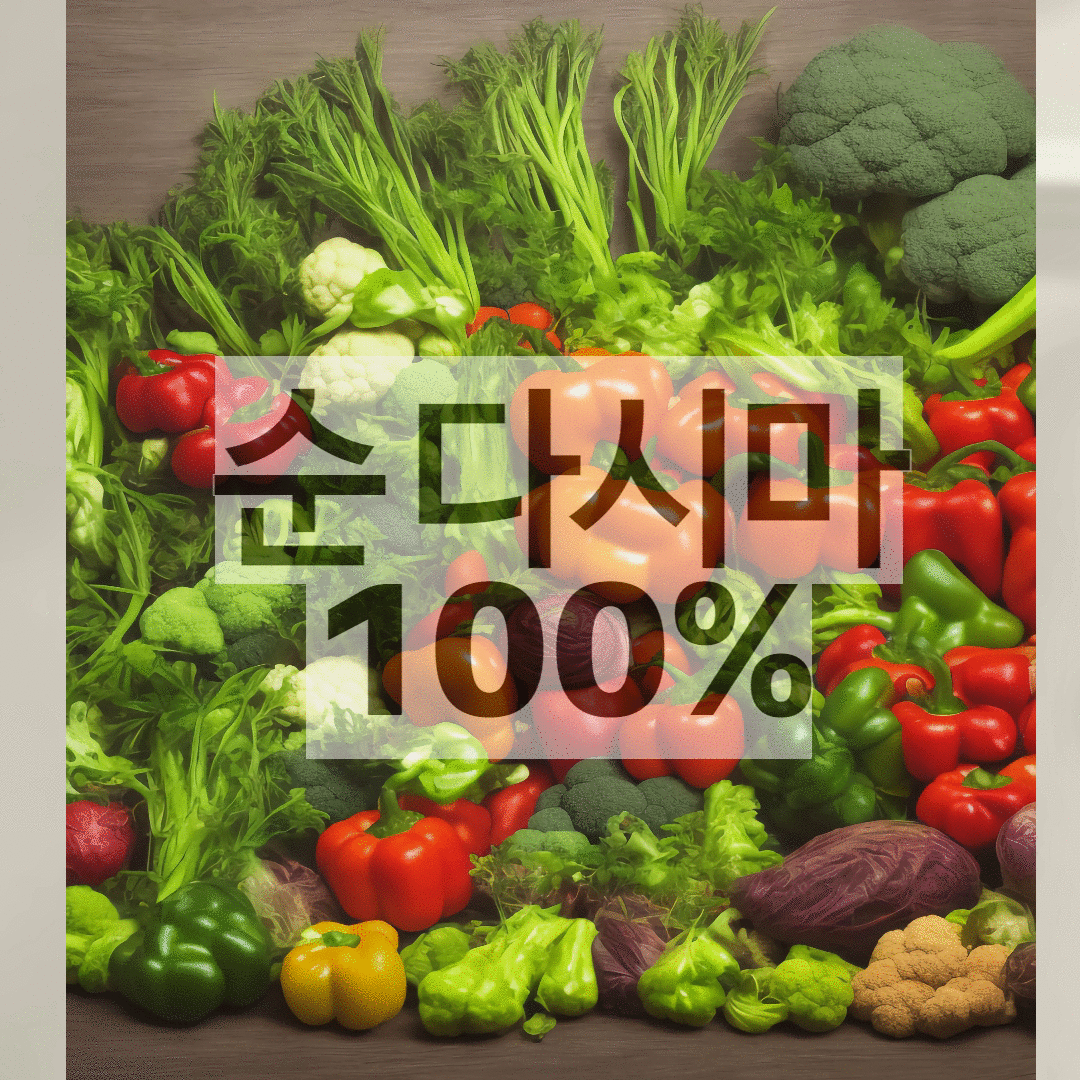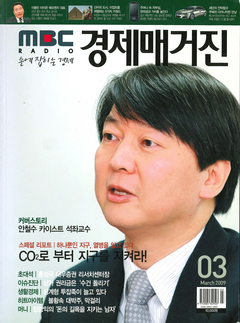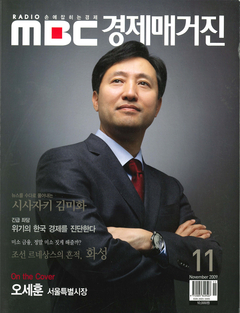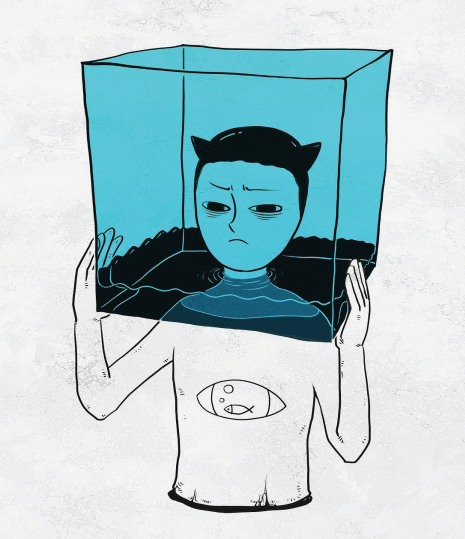
지난 7월 20일 통계청 발표 결과, 15세 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데 평균 10.1개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내 취업한 청년이 47.4%로 가장 많았다. 3개월에서 1년 미만 걸린 학생은 26%, 1~2년 걸린 청년은 11.7%, 2~3년은 6.7%, 3년 이상은 8.2%였다.
취업 준비 기간 1년 이내가 전체의 7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유행을 감안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졸업 후 6개월 지나서도 실업 상태이면 심리적 압박감이 고조된다. 6개월 이상 취업이 늦어진 비율이 38.5%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년 이상 취업 못한 비율이 14.9%나 이르고 있다. 졸업 이후 2년 이상 취업을 못한 상황이라면 패닉 상태, 더 지나면 소위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족’이 되기 쉽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 취업은 졸업 후 대책보다는 재학 중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향이 이상적이다. 재학 중 대책이란 전공 공부를 착실히 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 직장을 일찌감치 정하고 준비한다. 준비는 지식공부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과 기능 실습을 틈나는 대로 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전공 무시하고 취업시험만 준비하면 설사 첫 직장을 일찍 구했다고 해도 실망하고 곧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취업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전공과 전문성 있는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 시험공부만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입사 해가지고는 직장 생활의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7월 하순에 내놓은 노동시장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4개월 넘는 장기실업자들이 지난해 동기보다 월평균 4만9000명이 증가했다. 실업 장기화 비율이 늘어난 데에는 구직 단념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자동화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수치로 나타났다. 대면서비스업의 일자리 중 자동화 고위험군의 취업자가 2017년 4월과 지난해 10월 사이에 10.8% 감소했다. 감소폭이 자동화에 덜 영향을 받는 일자리에 비해 4배나 높았다.
한국은행 이슈보고서가 말해주는 사실은 학교에서 전공을 철저히 않고 나와서는 갈 데가 마땅하지 않게 됐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기업이라고 취업시험 합격해서 좋다고 해도 그가 맡은 일이 일반적인 사무행정직이라면 결코 안주하면 안된다. 사무행정직일수록 자기만의 전문성을 찾아내서 타인이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실무적 전문성을 쌓아나가야 한다. 타 직원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의 AI 자동화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직장에 들어와서도 본인의 노력 강도에 따라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재학 중에 전공을 철저히 공부하여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길이다. 자격증은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므로 좋고 나아가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재학 중에 관련 직종에서 최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첩경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