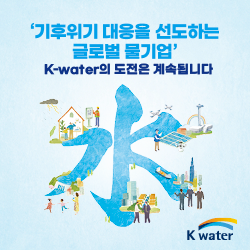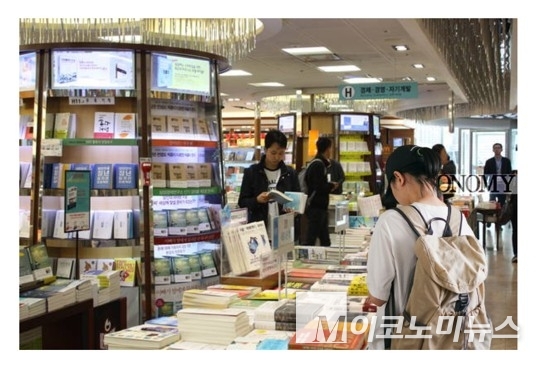
요즘 서점에 가면 사람의 마음 달래고 다독이는 심리학 서적이 유난히 눈에 띈다. 『미움받을 용기』, 『경계를 정하라, 내 마음을 지켜라』 같은 제목들은 나를 지키는 법을 가르친다.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혼자라도 괜찮은 법을 알려주는 듯하다. 시대의 요구일까? 사람들은 부딪히고 상처받고 타협하는 과정보다 혼자 견고한 성을 쌓는 길을 택하고 있다.
필자 역시, 점점 그런 경향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심리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이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포장되어 있고, 마음에 맞지 않은 친구와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애로 불린다. 심지어 ‘악당이 되는 걸 두려워 말라’는 구호가 유행이다. 갈등을 감수하기보다는 아예 관계 자체를 줄이고 외부를 차단하는 쪽이 더 쉽고 안전하다고 믿는 풍조다.
싫은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마음이 불편한 장면은 아예 외면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선거에서 내 편이 지면 허무와 분노가 몰려오고 급기야 정치 자체를 외면해 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만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진다.
작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떠나는 현장을 보고, 동시에 무종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종교는 본래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이제 종교마저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약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그 결과 믿음의 빈자리는 방대한 개인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물론 나를 지키는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을 배워가는 사회적 기술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부딪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데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러한 회피를 미덕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기존 질서와 가치가 낡았다면 분명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혼자만의 성벽 안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불편한 타인과의 대화, 의견충돌,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보호의 기술이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고 이겨내며 새로운 질서를 함께 빚어가는 용기다.
나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한,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로 쪼개져 갈 것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로 말이다.
문득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 회담을 갖고 국민의 힘 대표가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치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갈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힘은 특정 진영의 승리나 패배가 아닐 것이다. 서로를 향한 경청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비롯된다.
내 편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불편한 목소리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