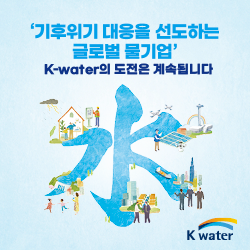예로부터 조상들은 “붉은 색은 귀신을 쫒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쑤고, 정초에 팥 고사떡을 만들고, 혼례나 상례 때 팥밥을 짓는 등 팥은 주로 절기나 의례 때 먹었다. 팥은 그만큼 신앙과 제의(祭儀), 그리고 일상의 경계에 있던 특별한 곡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팥은 시장에서도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다. 팥의 재배면적은 이상기후, 작물 전환,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3년에 약 3690ha 수준에 그쳐 지난해 팥 생산량은 5256톤. 역대 통계 사상 가장 적었다.
이 때문에 국산 팥 1kg이 약 22,500원. 일반 콩값보다 3배 이상 높다. 심지어 국산 팥 500g에 만 2천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산 팥값은 수급 불안정과 공급부족으로 일반 곡류에 비해 비싼 편이고 그 가격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팥을 재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팥 소비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농가들이 단일 작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팥은 약 3만 톤 수준이라, 부족한 물량을 수입으로 채우고 있다. 이를테면 여름철 팥빙수 등 계절수요가 증가할 때, 지난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신고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 팥은 약 1100톤, 페루산 137톤, 태국산 약 42톤 등을 수입했다.
국산 팥과 수입 팥은 분명 맛과 향에서 차이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산 품종인 ‘홍진’ ‘아라리’ 는 중국산보다 항산화 활성도가 20~35%가 높았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국산 팥은 조리 시간이 짧고 물 흡수율이 높아 팥죽이나 앙금 가공에 적합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실험에서 국산 팥의 단맛, 향미 점수가 수입 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팥이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와 흙에서 형성된 팥 토종 유전자의 다양성에다 항산화 성분, 향미, 문화적 가치 등 모든 걸 갖춘 프리미엄 곡물이라는 걸 보여준다.
수입 팥은 품질이 균일한 장점이 있으나 향이 떨어지고, 대량 건조와 보관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률이 높이 다소 높아 맛이 떨어지는 게 흠이다. 그만큼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 지나치게 단맛이 난다. 특히 껍질이 질기고 삶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전통 요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팥의 제국’은 콩의 원산지인 한국이 아닌 일본이 세웠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은 팥을 산업화했다. 앙코(餡子)로 정제해 단팥빵, 도라야키(팬케이크에 일본식 팥소를 넣은 빵). 모찌 같은 단맛 문화로 발전시켰다. 반면 우리 팥은 절기(節氣)음식과 제의용에 머물렀고, 1970년대 이후 농정의 중심이 벼와 콩으로 쏠리면서 틈새 작물로 밀려났다.
두 나라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일본은 팥의 당도, 색상 조긱감을 기준으로 표준화를 추진했다. 그들의 나노 단위까지 가는 미세한 팥 가공 공정을 보면 감탄사가 나온다. 일본 농림성과 제과업계가 함께 팥의 수요 공급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도, 산업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팥죽 한 그릇 가격이 만 원을 넘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찬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노점 붕어빵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달콤한 팥소가 들어 있는 우리의 겨울 간식이 외국인들을 사로잡은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붕어빵의 맛과 디자인의 조화에 있다고 한다. 달콤한 팥소가 겨울철 추위 속에서 온기를 주고, 물고기 모양이라는 유쾌한 상징이 어우러져 재미와 먹는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기 때문이란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에서 시작된 붕어빵이 한국의 거리 음식으로 자리 잡은 뒤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팥소의 인공적인 달콤함만은 아니리라. 우리 팥만이 가진 달지도 않으면서 은근한 단맛을 내는 진정한 맛과 구수한 향, 그리고 무쇠 주물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얹어 다시 굽는 한국적 슬로우푸드라는 점도 영향이 클 것이다.
이처럼 붕어빵 한입에 우리의 맛, 우리의 손길, 우리의 정이 들어갈 때 한국 겨울의 길거리 음식으로서 붕어빵은 진정한 매력이 완성된다, 고 필자는 생각한다.
팥은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기능성 식품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종(浮腫) 완화, 체내 해독, 심혈관 건강, 체력 회복 등 여러 건강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니 팥은 단순한 과거의 곡물만은 아니다. 붕어빵이든 뭐든 건강기능 식품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원료다. 이를테면, 고사떡에 어포나 두부 등을 넣은 샌드위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팥의 부활은 향수가 아니다. 팥의 제국으로 가는 K-food의 시작이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밭에 수천 년간 이 땅의 유전자를 전해 온 붉은 씨앗-팥을 심자. 그리하여 우리의 팥이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건강을 지키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싶다.
[특별기획-제2편] 콩의 원산지를 잃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