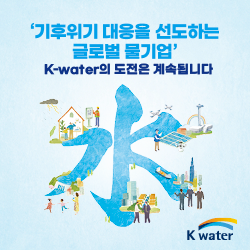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라는 일침을 놨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의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천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이 사 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실력이 있 다고 말하는 때에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자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주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반대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력주의나 능력주의는 개인이나 가정의 의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아래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에서도 사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경쟁이 조기화된 싱가포르
능력주의 교육제도(초엘리트 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만)라고 하면 싱가포르를 빼놓을 수 없다. 인구는 적고 천연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1965년 리콴유의 국민행동당과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결렬된 다음 연방에서 추방된 아픈 경험이 있다. 리콴유가 텔레비전을 통해 울면서 독립을 전한 것을 많은 국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절망적인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싱가포르는 1960년대의 빈곤한 국가에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사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15세 단계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모든 분야를 석권할 정도로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에서 능력별 학급편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다. 초기에는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퇴하였다. 하지만 그후 7~8세인 2학년 종료 시에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것을 진급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퇴학도 종용되었다. 1979년부터는 3학년 종료 단계 에서 능력별 선별시험을 실시하여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쉬운 커리큘럼을 배우도록 하여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들이 진학 코스에 진학을 할지 직업 코스에 진학을 할지는 9세에 정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였다(2008년까지 학생들은 세 개의 코스에서 한 개의 코스에만 진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 ‘초등학교 졸업시험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이므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나 사활을 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PSLE 휴가를 얻을 정도라고 한다. 중학교 진학은 6개교를 선택하여 입학원서를 낼 수 있지만 초 등학교 졸업시험의 성적이 중학교 입학을 좌우한다.
초등학교 졸업생 약 3분의 2는 엑스프레스 코스에 들어가 중학교에서 4년을 배운 후 O레벨(GCE Ordinary Lenel) 시험을 치른다. O레벨 시험에서 상위 20%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A레벨(Advance Level)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만약 희망 하지 않는다면 기술단과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약 20% 내외는 보통 코스에 진학하여 4년간을 마친 후 O레벨보다 난이도가 낮은 N레벨(Normal Level) 시험을 치러 합격 하면 O레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학생들은 기술단과대 학이나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기술교육학 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10% 내외의 학생들은 기술 코스에 진학하여 보통과 과목과 기술계 과목을 학습하여 N레벨 시험을 치른다.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 ITE에 진학할 수 있다. 마지막 1.5% 내외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 학생들은 1년 더 학교에 다니든지 한번 더 시험을 치르든지 직업 훈련소에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학문 수준이나 진로가 다 른 중학교에 분류되므로 초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를 두고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엘리트주의는 정부의 우생학 정책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학 졸업자끼리 결혼하면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학력자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1980년대에 정부 조직까지 설립하였다. 이 정부 조직은 싱가포르의 창설자이자 우생학의 신봉자인 리콴유 수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회제도가 능력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정과 지역의 영향이 큰 중국의 교육
중국도 사교육이 성행하는데 그 배경에는 가오카오(普通 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약칭 “高考”)라는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험 때문이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 수준이 높은 중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런데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중국인들이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빈부 격차도 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의 격차가 크다. 베이징대학이 2013년 8월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국 총자산의 63.9%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최상위층(상위 5%) 과 최빈곤층(하위 5%) 간에는 연간수입에서 242배의 격 차가 존재하며 격차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명문학교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므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적 변경이 가능하므로) 자녀를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상해시의 경우 학교는 통학구역 내의 학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립의 중점학교는 상해시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통학구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3만 위안 내외(학교에 따라 다르지만)의 학교 선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좋은 학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녀를 일류학교에 입학시키고), 공식(학교 선택료를 지불하여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인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에는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학교 선택료는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 법 제정 이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진학하도록 한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 존속하였던 중점 학교에 대해서는 고액을 납부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한 결과이다.
학교 선택료는 사회문제로도 대두되었는데 2005년에는 북서부 회족자치구에서 13세의 소녀가 통학구역 밖의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비용 10만 위안이 너무 비싼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10만 위안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유서를 부모에게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의 PISA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학생의 70%가 학교 교육 외에 부가적으로 수학 학급에 참가하고 있다. 또 한 2015년의 PISA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규모 사교육기관 등에서 주당 27시간을 보낸다고 답변하였다. 중국에서 지역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생기는 교육의 결과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큰 것도 교육제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0세기는 교육개혁의 세기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서 11세 단계 시험을 치러 학문적 학습을 주로 하는 그래머스쿨, 상업 및 공업의 테크니컬스쿨,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모던스쿨의 세 종류 학교에 분류되었다. 1944년의 교육법에 의해 전국적인 학교 선별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세 개로 크게 구분되었는데, 이는 교육이 사회 계급과 결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래머스쿨에는 중산계급 이상의 학생이 모이는 경향이 컸다. 1944년의 법은 이러한 세 종류의 학교에 동등의 사회적 위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였지만, 영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침투해 있던 계급 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1970년대에 노동당 정권은 이 제도를 개혁하여 종합중등학교를 도입하였다(현재 에도 일부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평등한 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도 과거에는 엄격한 능력주의 교육제도를 가졌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능력별 학교 선별제에서 종합학교로 전환한 후 학교내에서 능력별 반 편성을 하였으나 지역적·사회적 불평등 및 남녀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판명되어 1983년에 폐지되었다. 핀란드에서 시험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다른 학급에 분별하는 것은 현재 위법에 해당된다.(다음 호에 계속).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 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