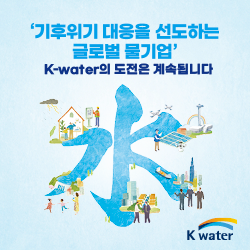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해 추정된 정상수준에 비해 약 9%p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2014년 기준 18.3%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변수의 경우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실제보다는 낮은 것으로, 2014년 기준 한국의 실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정상수준 추정치보다 8.5%p 높은 26.8%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수준과 정상수준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은 여전히 46%나 높다”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기준 조사대상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근로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